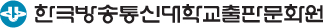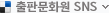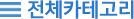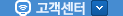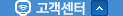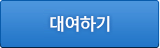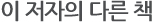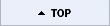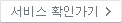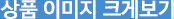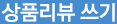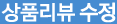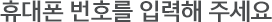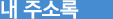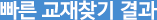- 홈
- eBook
- 보류
[eBook] 청소년에게 게임을 허하라
- ISBN : 9788920028151
- 김옥태, 배상률, 손창용, 원일석, 이숙정, 이장주, 이재진, 이창호, 임소혜, 장근영, 채영길 지음
- 2017년 09월 25일
- 대여 : 18,000원 (180일 , 0% 할인)
- 파일크기 : 10.8 MB
- 파일포맷 : EPUB
- 판매상태 : 보류
- 본 도서 상품 바로가기
디지털 세대에게 게임은
문화인가, 유해매체인가?
미디어·심리·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임의 긍정적 기능과 효과
집단적 게임포비아에 빠진 기성세대는 게임을 공부에 방해만 되는 유해매체라 여기고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 선택제’ 같은 규제를 만들어 청소년이 게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 내몰린 청소년에게 게임은 유일한 놀이문화라는 점이다. 즉 청소년 자녀를 둔 지금의 기성세대가 과거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오늘날의 청소년 세대 역시 게임을 일종의 또래문화로 여긴다는 것이다. 디지털을 일상생활로 체화한 청소년에게 게임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게임을 즐겨하는 청소년에게 나무라지 말고 그들이 어떤 게임을 왜 즐기며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지식습득과 성장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찾는 편이 보다 현실적이다.
“청소년의 폭력성은 게임 때문이다”라는 편견 깨기가 먼저…
수년 전 미국의 버지니아공대에서 한국계 미국인 조 씨가 총기난사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당시 국내외 언론에서는 그가 ‘카운터 스트라이크(Counter-strike)’라는 게임에 빠진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도되었다. 이 사건 외에도 가끔 청소년 강력범죄가 일어났다는 뉴스보도를 볼 때마다 나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무개가 게임 때문에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모든 원인을 게임에 돌리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이 폭력성을 갖게 되는 원인을 게임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단적인 주장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게임과 폭력성 간의 직접적인 인과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물론 그들이 비난하는 게임이 비극적 사건을 일으킨 책임에서 일정 부분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원인을 지나치게 쉽게 짚어 단순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가정, 교육 시스템, 사회 환경 등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제 기능을 다하였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이 게임과 청소년 관련 보도를 하는 데 있어, 일방적이고 막강한 효과를 발휘하는 매체로서의 게임 그리고 외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수동적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이란 시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
※ <청소년에게 게임을 허하라> eBook 이용 가능한 인터넷 서점
- 교보문고: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3058518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53219837
- 리디: https://ridibooks.com/books/2709000336
- 밀리의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86682
===
===
※ <청소년에게 게임을 허하라> eBook 이용 가능한 인터넷 서점
- 교보문고: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3058518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53219837
- 리디: https://ridibooks.com/books/2709000336
- 밀리의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86682
===